 |
| 현대인의 비만과 그로 인한 각종 성인병의 확산에 주범 역할을 해온 당분. 너무나 빠르게 단맛에 지배당한 요즘 식문화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일까. 단맛 없이도 사랑 받던 토속 음식이 그립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국 LA 현지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한인 이모씨는 수년 전 모국 방문 때, 마음 먹고 우리 전통 음식을 찾아 다녔다. 1980년대 초반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기 무섭게 그는 부모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기에, ‘진짜’ 우리 음식에 대한 ‘갈증’ 같은 게 있었다.
미국서 가정을 꾸린 뒤 이씨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모국 땅을 대여섯 차례 밟긴 했다. 그러나 워낙 일이 바빠서 고향도 찾지 못하고 다시 서둘러 LA행 비행기에 몸을 싣곤 했다.
그가 휴가다운 휴가를 내, 서울에 온 건 2012년 여름이 말하자면 처음이었다. 늦깎이 결혼 후 가정도, 비즈니스도 안정되어 마음 먹고 모국에서 하계 휴식을 취하기로 한 것이었다.
남달리 정이 많고 구수한 성격의 그가 가장 그리워 한 건, 1960~1970년대 한창 자라면서 먹은 우리 전래 음식들 맛이었다. 손바닥만한 종이 쪽지에 먹을 음식 리스트를 빼곡히 메모해 올 정도로 그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이었다. 모국에서 휴가를 보내며, 시골 소도시들을 적잖게 순회했지만 그의 혀끝에서 ‘옛 맛’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대신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설탕 듬뿍인 음식은 질릴 정도로 맛봤다.
토속적이고 전래적인 문화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음식이다. 하지만 음식 문화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나브로 변할 수 밖에 없다.
이 땅의 전래 음식들은 거칠게 말하면 20세기 초, 일제의 침략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변화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다시 말해, 1700년대 서민들의 밥상이나 1800년대의 그것이 맛을 기준으로 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사이 음식 맛은 질적으로 일변했다. 단적인 예로 전통음식의 근간이랄 수 있는 된장이나 고추장, 또 김치까지 사뭇 다른 맛으로 변했으니 다른 음식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수십 년 사이 음식 문화를 맛이란 측면에서 지배하는 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당분’이다. 찌개와 국, 나물 등 전통 음식들 가운데도 단 맛이 감돌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다. 양념 고기나 각종 육수, 군것질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담백해야 할 죽조차도 단 것들이 많다.
사실 단맛의 음식 지배는 예견된 것이었다. 왜? 사람은 본래 단맛을 좋아하도록 진화한 까닭이다. 단적인 예로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다. 과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수분이나 즙이 풍부해서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달기 때문이다.
단 성분, 즉 당분은 우리 몸에서 분해됐을 때 최종적으로 과당이나 포도당으로 변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분 선호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단 음식성분들이 칼로리가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으로 저장이 쉽다는 점이다.
현대인들의 대다수는 굶어서 죽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들은 굶는 게 보편적으로 가장 무서운 일로 여겨질 만큼 에너지 섭취가 결정적으로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였다.
언제 어디서고 칼로리가 상당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던 시절, 열량 넘치는 음식은 그러니 사랑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당분은 특히 에너지로 쓰고 남을 경우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저축’ 그 자체로 인식됐다.
진화적 관점에서 현대인이나 옛사람들이나 단 음식 좋아하는 본성에는 실상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음식이 전세계적으로 단맛의 지배에 놓이기 시작한 건, 역사적 관점에서는 극히 최근의 일이다.
바로 발달된 과학기술이 떨쳐내기 힘든 인간의 단맛 본능에 불을 지른 것이다. 설탕의 보급 확대와 인공 감미료의 양산이 음식 문화를 단기간에 바꿔놓은 장본인이라면 장본이라는 말이다.
설탕 소비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1900년대 초에 비에 2000년대 초반 현재 서너 배나 증가했다. 특히 20세 중반 들어 단 음식을 확산에는 인공 감미료의 기여가 컸다.
19세기 후반 개발된 사카린에 이어, 1960년대 아스파탐, 그리고 1990년대 들어 확산되기 시작한 슈크랄로오스 사용은 가공식품과 음료를 단맛 일색으로 바꿔놓다시피 했다. 대부분의 인공감미료는 열량이 크지 않지만, 설탕 수요를 대체하기보다는 사실상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설탕 수요 역시 같이 늘어났다.
인공감미료 개발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그 수요 확대에는 무엇보다 시장 논리가 크게 작용했다. 아스파탐, 사카린, 슈크랄로오스는 각각 설탕보다 대략 200, 400, 600배쯤 달다. 높은 당도가 저가로 단맛의 식품과 음료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이 된 것이다.
 |
| 노릇노릇한 빵 껍질부분. 당분과 아미노산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킨 결과이다. 단 음식에 끌리게 돼 있는 인간의 본능은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 배가 된다. (사진=라이너 젠츠) |
캐러멜은 끈적끈적한 말 그대로 캐러멜 과자를 상상하면 된다.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는 빵의 노릇노릇한 겉 부분 등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빵뿐만 아니라 군침 돌게 하는 구운 고기의 노릇한 부위는 마이야르 반응으로 인해 형성되는 것이다.
캐러멀 반응이나 마이야르 반응의 공통점은 색깔이 먹음직스런 느낌이 도는 갈색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때는 특유의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것이 바로 음식의 풍미를 특징지으면서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구운 고기나 빵이 아니더라도, 물기가 없거나 적은 음식들 가운데는 부분적으로 캐러멜화 현상과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도록 조리된 게 많다. 예를 들면, 자장면 소스의 양파나 당근 등을 볶으면 캐러멜화가 일어나고 자장면 양념 속의 돼지고기 조각 같은 것들은 마이야르 반응을 거친다.
 |
| 현대인들이 식사 후 즐겨찾는 디저트. 디저트는 특히 당분의 함유량이 높은 경향이 있다. (사진=킴벌리 바드먼) |
현대인의 비만과 그로 인한 각종 성인병의 확산에 단 음식이 주범 역할을 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꼭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식이 달지 않던 시절 과체중인 사람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실제로 50~60년 전만 하더라도 배가 나오면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
 |
| 양파와 당근을 볶아 만든 소스. 캐러멜화 반응으로 인해 단맛이 돋보이게 된다. (사진=스투 스피박) |
한번 단맛에 길들여지면, 더 더욱 단맛을 찾게 돼 있다. 단맛에 주력하는 음식 문화가 쉬 바뀔 수 없는 배경이다. 단맛 없이도 사랑 받던 토속 음식의 복귀는 요원해 보인다.
다만 30~40년 전의 우리 식탁에 올랐던 토속 반찬이며 식품들이 음식의 ‘오래된 미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하지만 음식 문화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른바 ‘달삼쓰뱉’의 원초적 본능을 물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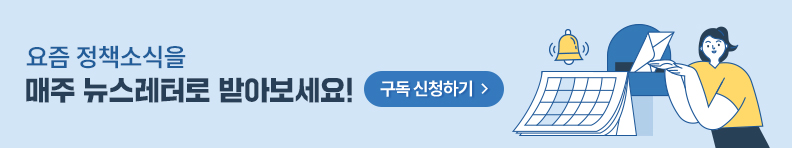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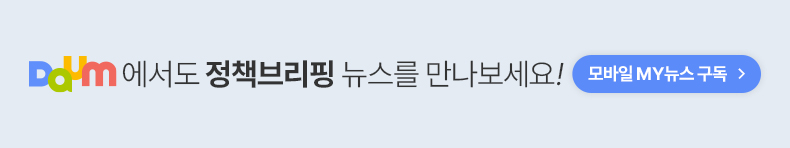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7/9cb9da1b11f3db7be804c8e18a080b6e.jpg)






![[’24.11.4.~11.8. 국민 곁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11/217583dc5c605e43ef13b39ab4cbec0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