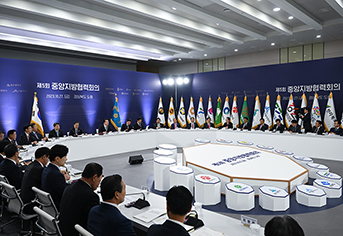2019년 여름 ‘노 재팬(No Japan)’ 깃발 1100개가 서울 을지로와 청계천 일대 가로등에 걸렸다. 독립운동 단체가 한 것이 아니다.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하늘을 치솟자 지자체인 중구청이 민심을 겨냥해 내건 것이다.
그때 한국에 일본은 없었다. 일본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혼다나 도요타 승용차를 타고, 아사히 맥주를 마시고,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고, 일본 영화를 보면 ‘친일파’니 ‘매국노’니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대형 마트 3사는 알아서 일본산 맥주 수입을 중단했고 동네 편의점들은 냉장고에서 일본 맥주를 모두 빼냈다. 이런 분위기를 거스리는 사람은 감시를 당하고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거의 ‘파시즘적’ 분위기였다.
4년이 흘렀다. 새로 나온 일본의 어느 맥주는 편의점에서 동이 나서 못 판다고 한다. 일본 맥주 수입은 1분기에 전년 대비 150% 늘었다. 유니클로는 SPA(기획-생산-유통을 한 회사가 하는 브랜드) 1위를 탈환했다. 일본산 승용차 판매량은 차종에 따라 전년 대비 50~100% 이상 늘었다. 작년에는 일본에 뿌리를 둔 ‘포켓몬빵’ 열풍이 불어 전국 편의점이 북적였다.
극장가를 가보자. 3월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은 일본 영화 최초로 관객 500만을 돌파했고, 1월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450만 명이 넘었다. 주 관객층은 젊은이와 일본 만화와 게임을 보고 자란 30대들이다.
코로나 빗장이 풀리자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간 나라는 일본이다. 최근 세 달 새 200만 명이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일본 내 해외 관광객 세 명 중 한 명은 한국인이다.

그럼 일본은 어떤가. K-컬처가 일본 대중문화를 파고든 지 오래다. 세계적 걸그룹 블랙핑크가 4월 8~9일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다. 입장권은 조기 매진됐고 일본 청소년 11만 명이 열광했다. 세계를 강타한 한국의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 인기는 일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일본 언론의 조사를 보면 일본인이 여행 가고 싶은 나라 부동의 1위는 한국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방한한 외래 관광객 80만 명 중 일본인이 20만 명으로 2위인 미국인(8만 명)보다 두 배 이상이다. 중국인은 7만 명이다. 이제 명동의 상인들은 중국어 대신 일본어를 배워야 할 판이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어느새 서로에게 해외여행 선호국가 1위가 된 것이다. 3월 21일에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왔다. 국내에서도 일본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학교가 많다고 한다.
한류는 이제 일본에서 일시적 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 대중문화뿐 아니라 한식, 뷰티, 관광, 한국어 배우기 등 전반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
그럼 두 나라 국민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호감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말 일본 국민 17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전년 같은 조사에서는 37%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42.2점이다. 미국 다음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33.6점으로 중국(35.8점)은 물론 북한(33.8점)보다도 낮았는데 조사 대상 20개 나라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두 나라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을 때 엄청났던 반대 여론을 기억한다. 당시 김 대통령은 “더 이상 문화 쇄국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지만, 한국이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될 거란 우려와 반민족적 결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결과는 기우였다. 일본 문화상품은 한국에서 기를 펴지 못했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류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개방의 문을 열자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 문화의 역수출을 이뤄낸 것이다.
올해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25주년이자 일본 내에서 한류의 씨앗이 된 ‘겨울연가’ NHK 방영 20주년이 되는 해다. NHK방송이 ‘겨울연가’를 방영한 2003년 아사히신문이 선정한 ‘유행어 대상’은 배용준의 일본식 별명 ‘욘사마’가 차지했다.
이게 문화의 힘이다. 문화 생산과 소비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다. 윗세대로 갈수록 역사·정치 문제를 문화와 연결짓는 경향이 있지만, 젊은 세대는 그런 면에서 유연하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지배하는 건 젊은 세대다. 하지만 바탕이 있어야 한다. 올해 도쿄와 서울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가 크게 부각됐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문화와 미래 세대 간의 교류를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확대하자는 데 두 나라가 합의한 것이다. 두 나라 경제단체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만들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방일해 게이오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도 “여러분이 한국 청년들과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청년 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우리들이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는 요동친다.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서 그의 계산과 소신에 따라 외교적 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탄다. 물론 그게 양 국민의 정서와 민간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복원력과 파급력이 강한 것은 문화적인 것들이다. 문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마중물이자 지름길이다. 문화에는 특정 이념도, 학벌도, 경쟁도, 공정도 끼어들기 어렵다. 누리고 느끼면 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분위기를 살려 양국의 문화·관광·체육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미래 문화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한다. 민간 교류를 후원하고 촉진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보여서 좋다.
다시 4년 전의 ‘노 재팬’을 생각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것일까. 아니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이 맞는 것인가.
고작 4년이 지난 지금, 언론에서도 ‘예스 재팬’이란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극적인 반전이 이뤄졌다. 국내의 일본 문화 열기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윤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 후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결국은 이게 문화의 특성이 아닐까. 언젠가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옛말이 될지도 모르겠다.

◆ 한기봉 전 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과 신문윤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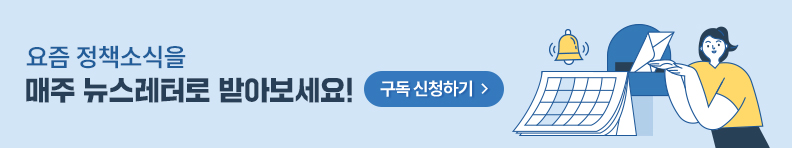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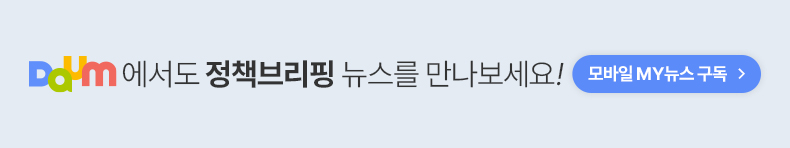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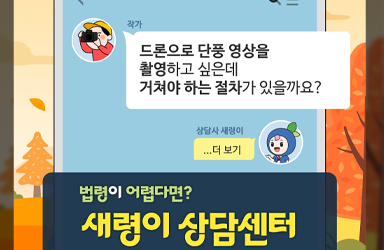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 뉴스위크 인터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12/8984513668bfcb5351ed652346d39d9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