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일하는 모든 세대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필수과제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 청년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노동개혁의 ▲당위성 ▲내용 및 방향 ▲주요 쟁점사항 ▲외국의 성공사례 ▲성공조건 등을 담은 전문가 릴레이 기고를 추진,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공동기획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높이고, 노동개혁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편집자 주>
 |
|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치인에게 있어 노동개혁은 벌집 같은 거다. 괜히 건드려 봐야 좋을 것이 없다.
피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피하고 싶은 게 노동개혁이다. 알아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말게 되는 게 노동개혁이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IMF 위기 때 그랬듯이 더 이상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노동개혁은 단행된다.
노동개혁의 막이 올랐다. 그나마 IMF 때처럼 강요된 경우가 아니라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상태다.
부디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개혁은 인기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성과 역시 단숨에 나타나지 않는다. 서서히 나타난다. 그래도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변화의 폭은 가히 드라마틱하다. 독일이 그랬다.
통일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독일의 노동시장은 깊은 병에 시달려야 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직장을 구할 의지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그들은 사회보장제도에만 의존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기업대로 고충이 컸다. 높은 인건비 때문이었다.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으로 회사를 옮길 궁리에만 몰두하였다.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당시 독일은 그 어디에서도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가 없었다. ‘부자’ 독일은 ‘유럽의 늙은 병자’로 전락했다.
독일 경제의 위기는 구체적 수치로 보여졌다. 2001년 기어코 재정적자율이 1%가 되더니 급기야 2003년에는 재정적자율이 4%에 달했다.
덩달아 기업은 일자리를 줄여야 했다. 실업자들을 감당해야 할 정부의 금고도 텅텅 비어가고 있었다. 2005년에는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2%를 넘어섰다.
특히 옛 동독지역은 20~25%에 달할 정도였다. 독일 내 실업자 수가 무려 500만명에 육박했다. 국가경쟁력 1위 독일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
| 통일 이후 경제부진으로 ‘유럽의 환자’로 전락했던 독일이 노동개혁을 거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되찾았다. 달라진 독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슈투트가르트 진델핑엔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장 모습. (사진=저작권자(c)dpa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2003년 당시 슈뢰더 정부는 ‘아젠다 2010’이라는 전후 최대 개혁정책을 단행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개혁의 핵심 내용은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보장제도 개혁’이었다. 우선 노동유연성 제고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렇게 요약된다.
“고용 다변성을 수용하되, 고용의 질을 높인다”.
경제의 경기변동 상황이 급변하고, 이에 따라 고용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산업현실의 변화를 애써 모른 척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이다.
다만, 다변화된 일자리의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도모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 이것은 비정규직 근로형태의 법제도로의 포섭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로 구체화되었다.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모두 지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또 이렇다. 맹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포기로 요약된다. 일자리를 찾고자 한다는 의사를 내비쳐야 사회보장제도도 작동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처음부터 오로지 사회보장제도에만 기대려 했던 이른바 ‘독일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독일 노동개혁의 상징적 제도가 바로 ‘미니잡’이다. 지금도 미니잡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독일 국민들에게 노동개혁은 반가울리 없었다. 사회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무너뜨렸다는 자괴감부터,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린데 대한 분노까지 비판은 매우 컸다.
하지만 개혁은 실행되었다. 그 결과는 가혹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2005년 9월 조기총선에서 패했다. 정권을 메르켈에게 넘겨야 했다.
이후 독일의 변화는 놀라웠다. 2015년 7월 독일 실업률은 6.4%로 집계되었다. 1990년 통독이후 최저수준이다.
통계수치를 굳이 들먹일 필요까지도 없다. 유럽 경제위기상황에서 독일은 홀로 호황이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성과가 전적으로 노동개혁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뼈아픈 노동개혁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독일 노동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이 시대 우리의 노동개혁과 같을 수는 없다. 독일노동개혁은 독일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이었고, 이번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고용확대라는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노동개혁은 왜 우리가 개혁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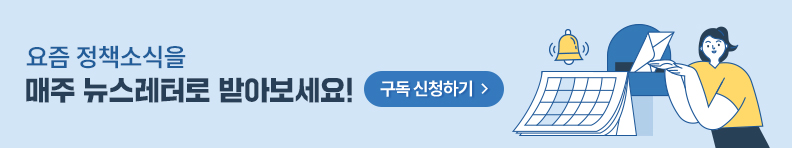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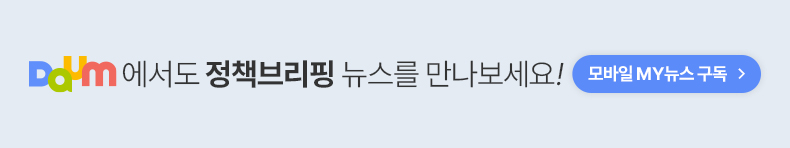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7/9cb9da1b11f3db7be804c8e18a080b6e.jpg)






![[’24.11.4.~11.8. 국민 곁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11/217583dc5c605e43ef13b39ab4cbec0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