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채식주의자>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처럼 대중적 인기를 끌지도 못했다. 소설이 나오고 2년 뒤에 선보인, 이번 수상을 계기로 특별상영회를 열기로 한 영화 ‘채식주의자’도 B급 영화 취급을 당하면서 작품성과 흥행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당시 영화를 보면서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배우가 스타가 아니어서, 제작비가 적어서가 아니었다. 소설이 가진 인간 심리에 대한 섬세함을 잃고 시각적 자극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한강은 시대 분위기와 대중의 기호를 읽어내는 감각을 지녔거나 상업적 계산을 하는 작가가 아니다. 그랬다면 <채식주의자>나 그 연작으로 이상문학상을 받은 <몽고반점> 같은 독특한 소재와 인물, 밀도 있는 구성, 어두운 주제의 ‘한강’다운 작품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의 작품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문학적 생명력을 지속하고,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래도 맨부커상 수상은 놀라운 일이다. 차라리 우리가 매년 학수고대하는 노벨 문학상을 원로 문인 중에 한 사람이 수상했다면, 더 난리법석을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는 “그럴 때도 됐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노벨상은 그것이 문학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상황이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작용하니까.
 |
|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진열된 한강의 <채식주의자>.(사진=동아DB) |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외국에서도 작품성 인정
맨부커상은 다르다. 어느 나라보다 문학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영국이 권위와 가치를 자랑하는 100% 순수한 문학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문학 사상 첫 수상이 놀랍고, 값지고, 자랑스럽다. 더구나 오르한 파무크, 옌렌커 등 쟁쟁한 작가들을 물리치고 받았다.
새삼 <채식주의자>의 문학성에 대해, 작품에 대해 호들갑스럽게 평가를 하는 것은 별 의미도 없고 낯간지럽다. 그건 상을 받기 전까지는 무관심하다 갑자기 소설책 사겠다고 난리를 치고, 읽고는 “역시”라고 감탄하는 것만큼이나 어색한 일이다. 이제는 보이드 턴킨 맨부커상 심사위원장의 “치밀하고, 정교하며, 충격적인 소설은 독자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며, 꿈에까지 나올 수 있다”는 한마디로 이제는 충분할 것이다.
소설의 주제 역시 장황하게 줄거리와 등장인물, 그들의 행동과 관계를 들먹이지 않아도 작가의 수상 소감의 한 부분인 “작품을 쓰는 동안 인간의 폭력성과 욕망에 대한 내 끝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려고 했으며, 가능한 한 그 질문 속에 있으려 했다”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
이번 <채식주의자>의 수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번역의 힘이다. 한류를 상징하는 리듬이 있는 K-팝이나 영상이 있는 드라마와 달리 글로만 표현되는 문학은 그 자체로는 세계인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 그들의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문학성을 가진 작품도 그 나라의 언어적 감성과 감각으로 되살리지 못하고 단순 번역만 한다면 향기와 느낌을 잃어버린다. 문학에서 번역을 ‘제2의 창작’이라 하고, 외국 번역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맨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이 번역자까지 나란히 수상자로 선정하는 이유이다.
한국 문학 세계화 위해 전문 번역의 힘 중요
국내 전문 번역인재 양성 필수
<채식주의자>의 이번 수상에는 이미 심사위원단에서까지 공식적으로 “완벽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번역이 창작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 턴킨 위원장은 “매순간 아름다움과 공포가 묘하게 섞인 작품과 잘 어울린다”고 했다. 그 번역자가 한국인이 아닌 영국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우리를 놀랍게 한다. 그것도 불과 6년 전에 문학번역가를 꿈꾸며 한국어 공부를 독학으로 시작한 케임브리지대학 출신의 28세 여성 데버러 스미스가 그 주인공이다.
 |
| 외국어로 번역돼 출간된 한국 문학 책들. 왼쪽부터 황석영의 <심청>, 한강의 <채식주의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
번역은 ‘시인의 작업’과 비슷하다는 그녀는 <채식주의자>를 단순히 번역하지 않고 작품의 ‘리듬’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한다. 이 같은 열정과 고뇌는 과장이 아니며, 그녀의 번역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기도 하다. 영국 BBC가 “훌륭한 문학작품을 번역하고 있다면 그 번역은 영문학으로도 훌륭한 작품이어야 한다”는 그녀의 말을 인용하면서 “번역가가 상을 받을 만하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그녀의 말대로 <채식주의자>는 맨부커상 심사위원단이 “영어로 완전히 제대로 된 목소리를 갖췄다”고 할 만큼 영문학으로도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 이번 수상이 한국 문학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준 셈이다. 만약 번역이 엉망이었다면 영국인들에게 <채식주의자>가 독창적이고 치밀한 구성, 심리묘사를 가진 소설로 비춰질 수 있었을까.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설국>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될 수 있었을까.
번역은 좋은 작품이 있어야 하고, 작가 못지않은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번역자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 문학에 젊고 좋은 작가와 작품은 많다. 번역자들도 많다. 그런데 대부분 외국어를 잘하는 한국인 번역가들이다. <채식주의자>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일본 소설을 국내 출판할 때 번역을 누가 하는가.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인가, 일본어를 잘 아는 한국인인가. 소설이든, 영화든 번역을 그 나라 사람이 맡아야 하는 이유는 데버러 스미스의 번역에 대한 맨부커상의 평가가 이미 말해주었다.
그런데 왜 한국 소설을 영어로 출판하면서는 대부분 한국어를 아는 영국이나 미국인이 아닌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번역하는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도 그랬다. 한국어를 잘 알고,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고, 문학적 감각까지 가진 데버러 스미스 같은 외국인 번역가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말 텐가.
그렇다면 하루빨리 그런 번역가를 찾고 길러야 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 문학, 한글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는 많아졌다. 그들이야말로 한국 문학, 나아가 한국 문화 세계화의 중요한 동반자일 것이다.
글 · 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위클리공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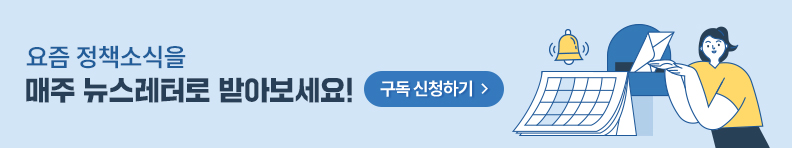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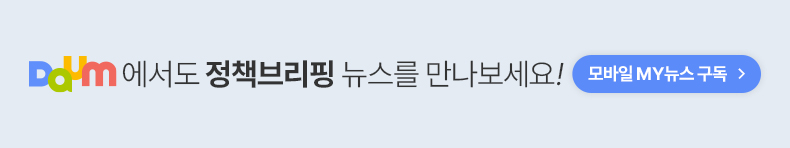





















![[전문] 정부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문 (2024년 11월 4일)](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4/d78af517693f8fd252ca0b9c0d2f307f.jpg)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7/9cb9da1b11f3db7be804c8e18a080b6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