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자리가 더 많았지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는데도 아무도 일어날 생각을 안 했다. 나도 불쑥 일어서기가 쑥스러웠다. 엉덩이를 반쯤 들었다가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휴일 오후의 극장은 영화 속 장면만큼이나 고즈넉했다. 극장에 불이 켜지고야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났다. 표정은 꿈에서 깬 듯했고 아무 말들이 없었다. 상영관 밖으로 나올 때쯤 뒤통수에 한 마디가 꽂혔다.
“그래 맞아. 인생 뭐 별 거 없어.”
맞다. 어느 아주머니가 중얼거린 이 말이 이 영화에 달린 수많은 관람평 중 최고의 촌철이 아닌가 싶다.
작년 12월 21일에 개봉해 5만 명이 봤다. 세계적 작가주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짐 자무시의 영화다. 다양성영화라는 말은 좀 어려우니 그냥 인디(독립)영화, 예술영화라고 하자. 그런 장르 영화치곤 흥행에 성공해 누구는 ‘아트버스터’라고 불렀다. 해외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됐다. 국내에선 상영관이 몇 군데 되지 않아 원하는 시간에 보기는 힘들다.
영화는 주인공의 일주일을 요일 별로 그저 따라갈 뿐이다. 주인공은 매일 아침 6시 10~15분 사이에 알람이 없어도 눈을 뜬다. 아내에게 굿모닝 키스를 하고 시리얼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아내가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일터로 향한다. 매일 같은 노선의 시내버스를 운전한다. 승객들의 이야기를 엿듣다 빙긋 웃기도 하고 백미러로 힐끗 쳐다보기도 한다. 영감이 떠오르면 폭포수 앞에 앉아 점심을 먹을 때나 쉬는 시간 틈틈이 비밀노트에 시를 쓴다. 퇴근해서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의 일을 이야기한다. 아내는 당신의 훌륭한 시가 아까우니 시집을 내자고 조르지만 건성으로 대답한다. 그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 (사족: 넬리라는 이름의 이 개는 2016 칸영화제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를 한 개에게 수여되는 ‘팜도그(Palm Dog)’ 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는 잉글리쉬 불독 품종이다.) 돌아오는 길에 단골 바에 들러 맥주 한 잔을 마신다. 집으로 돌아와 시를 쓰거나 잠자리에 든다. 그는 핸드폰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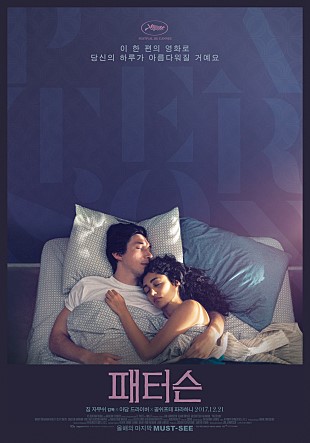 |
| ‘패터슨’ 영화 포스터. |
탄탄한 기승전결이나 놀라운 반전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영화팬에게는 졸린 영화임에 틀림없다. 서사보다 여백이 많은 영화다. 평양냉면처럼 슴슴하다. 어떤 관객은 “짐 잠오심 감독님, 죄송합니다. 잘 잤습니다”라고 영화평에 남겼다. 그런데도 ‘내 일생의 영화’로 꼽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영화의 메시지는 한 마디로 이렇다.
“삶의 아름다움이란 대단한 사건이 아닌 소소한 것들에 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도 신비롭고 아름다울 수 있다.”
주인공의 일상은 같은 노선, 같은 버스의 운행처럼 반복에 불과한 듯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마주치는 사람들도 바뀌고 풍경도 조금씩 달라진다. 주인공의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한 듯 보이는 건 관객의 생각일 뿐이다. 주인공에게는 보고 느끼고 좋아하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작은 소동에 휘말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는 날도 있지만, 그는 하루를 있는 그대로, 생기는 일 그대로 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보낸다. 그 평온한 일상을 지탱하는 특별한 하나는 있다. 일상에서 건져 올리는 시다. 특이한 디자인의 성냥갑 하나도 그에겐 시의 영감을 주고 그의 비밀 시작 노트는 매일매일 빈 페이지를 채워간다.
요즘 ‘소확행(小確幸)’이란 단어가 유행이다. 작년 말에 김난도 교수의 서울대 소비트렌드연구소가 2018년 한국 사회의 첫 번째 트렌드로 꼽은 말이다. ‘작지만 확실한(small, but certain) 행복’이라는 뜻이다. 오래 전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한스섬의 오후’에 처음 나온 단어다. (참고로 랑겔한스섬은 북유럽의 섬 이름이 아니라 췌장의 내분비 세포 이름이다.) 하루키식 소확행은 그의 표현을 빌면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쓸 때의 기분” 같은 것이다. 작년에 자주 언급된 ‘욜로(You Only Live Once)’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는 덴마크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휘게(Hygge)’와 상통하는 말이다.
영화는 마치 소확행의 교본 같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행복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다. 초등학생 때 다 그 책의 독후감을 썼다. 파랑새는 먼 데 있지 않고 내 창가에 있다고 배웠다.
그 사이 세상은 거대한 0과 1의 세상으로 재편됐다. 무한경쟁과 희망부재와 비트코인이 내 인생의 목을 조이는 팍팍하고 고단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새삼스럽게, 산보를 마치고 단골 바에서 맥주 한 잔을 음미하는 주인공처럼 혼술이 회식보다 좋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지직 소리 나는 레코드판이 부활한 것처럼, 백열전구가 발명된 지 백년이 넘었어도 양초가 여전히 빛을 밝히는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나온 아주머니는 왜 인생 별 거 없다고 말했을까. 많은 걸 기대하고 욕망했고 투쟁했지만 나에겐 해당사항 없음을, 로또 대박이나 백마를 탄 왕자는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챈 것일까.
평범한 일상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야말로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 데 오래 걸렸다. 행복은 매크로가 아니고 디테일이라는 것을.
그런데 영화에서 마지막 압권이 남아있다. 인터넷에 다 떠있으니까 스포일링 아니다. 가장 소중한 시 노트가 다 찢겨졌을 때, 아내가 위로하자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그냥 낱말에 불과해. 흐르는 물 위에 쓴 거야.” 얼마나 더 갈고 닦아야 이 정도 경지에 가려나. 이상은 영화 ‘패터슨’ 이야기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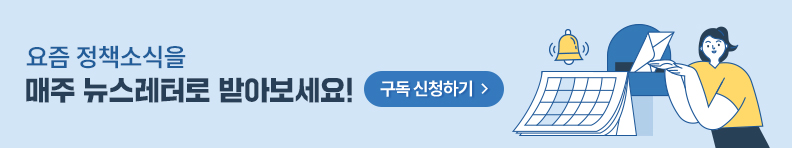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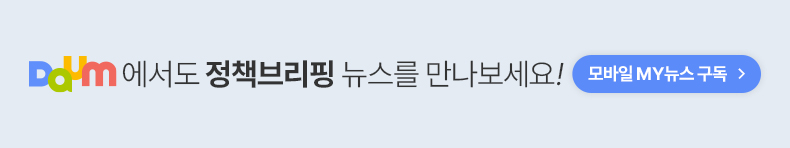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7/9cb9da1b11f3db7be804c8e18a080b6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