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쓰므’라는 영화가 있었다. 1967년 국내 개봉된 이 작품은 이집트(배후에 영국이 있지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 사람들의 독립투쟁을 다룬 70mm 대작 전쟁영화다. 그러나 찰톤 헤스톤,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걸출한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는데도 흥행에는 실패했다. 3년 뒤 비디오 테이프로 다시 나왔을 때의 제목은 ‘카슘공방전’이었다.
카쓰므는 뭐고 카슘공방전은 뭔가? 수단의 수도 하르툼(Khartoum)을 이렇게 이상하게 표기한 것이다. 하르툼은 백나일(白Nile)과 청나일(靑Nile)이 만나는 교통 요충지로 1824년에 이집트에서 건설했다. 아라비아고무의 집산지이며, 수단 공화국의 수도이다.
 |
| 영화 ‘카쓰므’ 포스터. |
‘카쓰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영화제목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첫째로 거슬리는 것은 외래어 남발이다. 라이프 오브 파이, 저지 드레드, 아워 이디엇 브라더, 나우 이즈 굿, 클라우드 아틀라스, 아임 낫 데어, 어게인스트, 컨빅션, 딥 블루 시, 유주얼 서스펙트…. 수도 없이 많다.
‘업 클로즈 앤 퍼스널’의 원제는 ‘Up Close And Personal’인데 영어를 웬만큼 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 ‘밀착 취재’라는 뜻의 미국 속어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2다이4’라는 영화는 ‘To die for'라고 짐작할 수 있으니 그래도 좀 낫다고 해야 하나?
알랭 들롱이 주연한 프랑스 영화 ‘트루아 옴므 아 아바트르’ 즉 ‘제거해야 할 세 남자’의 경우 국내 개봉 당시 ‘호메스’라는 괴상한 제목을 얻었다. 프랑스어로 된 긴 제목에서 거두절미하고 남자라는 뜻의 옴므(hommes)만 떼어 내어 보이는 대로 호메스라고 썼으니 무지의 극치였다고 할 수밖에.
그런데 외국 영화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인데도 마치 외국 영화인 것처럼 제목을 붙인 것도 부지기수다. 투캅스, 런어웨이, 블랙잭, 고스트맘마, 인샬라, 본투킬, 리베라 메, 부킹 쏘나타, 알바트로스, 2002 로스트 메모리즈, 내추럴시티, 마들렌, ing, 튜브, 후아유, 투가이즈, 호텔 코코넛.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게 해야 뭔가 있어 보이고 국제화 감각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말과 글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모자라는 탓이다. 반드시 원어 그대로만 번역하는 게 최고는 아니다. 유령이나 귀신이라는 뜻의 ‘The Ghost’를 ‘사랑과 영혼’이라고 해 공전의 흥행을 기록한 게 좋은 예다. ‘세 번째 남자(The Third Man)’를 ‘제3의 사나이’라고 한 것도 좋은 번역이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Bonnie &Clyde)’, ‘젊은이의 양지(A Place In The Sun)’,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As Good As It Gets)’처럼 작품 내용을 잘 드러내주는 우리말 제목을 붙이면 더 관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외래어 남발과 함께 지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헷갈리는 이름이다. 최근 제작된 영화 중에서만 살펴보더라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군도’라는 작품은 워낙 독일 극작가 프리드리히 실러의 ‘군도’, 즉 도적떼라는 말이 익숙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다고 할지 모른다. 더욱이 이 영화에는 ‘민란의 시대’라는 부제도 붙어 있다. 하지만 실러의 작품을 모르고 부제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군도(群盜)를 군도(軍刀)나 군도(群島)로 알 수도 있다.
‘경주’라는 작품도 그렇다. 이것은 신라의 수도인 경북 경주를 말하는 거지만 한글로만 볼 때 경주(競走)라는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인지 얼른 알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쟁을 다룬 ‘명량’은 명량해전(1597년)의 준말인데, 역사에 어두운 사람들이 얼른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다.
사실은 영화 제목만 그런 것도 아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적’의 뜻을 학교 다닐 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마적(馬賊)으로 알기 십상이지만 정확한 뜻은 마적(魔笛)이다. 이것을 마술피리라고 번역한 다음부터 뜻이 분명해지게 됐다. 또 독일 작곡가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는 무슨 뜻인가. 사수는 그렇다고 치고 마탄이 魔彈인지 얼른 알기 어렵다.
한여름 철에는 피서를 겸해 영화감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른바 공포 납량영화가 많이 선보이는 계절이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는 이런 영화보다 규모가 큰 사극을 비롯한 쫀쫀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반가운 현상이지만 제목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영화의 제목 서체가 서로 너무 비슷하다는 기사도 나왔던데, 이런 점에도 더 독창성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 임철순 한국일보 논설고문·자유칼럼그룹 공동 대표
언론문화포럼 회장,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한국1인가구연합 이사장. 보성고 고려대 독문과 졸. 1974~2012 한국일보사 근무. 기획취재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주필, 이사대우 논설고문 역임. 현재 논설고문으로 ‘임철순칼럼’ 집필.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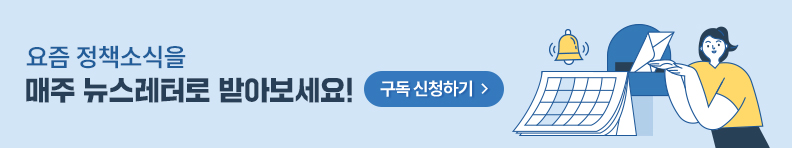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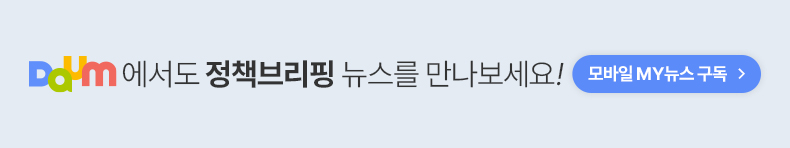



















![[전문] 정부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문 (2024년 11월 4일)](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4/d78af517693f8fd252ca0b9c0d2f307f.jpg)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07/9cb9da1b11f3db7be804c8e18a080b6e.jpg)




